 Music:파란낙엽 아내와 나 사이 詩 -이생진-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들어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출처] 아내와 나 사이 이생진 詩 아래 글이 있습니다.  *이생진 시인은 1929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남. 196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1996년 "먼 섬에 가고 싶다"로 윤동주문학상을, 2002년 "혼자 사는 어머니"로 상화 시인상을 받았음. 시집 '그리운 바다 성산포'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구순의 나이에도 작년에 38번째 시집 『무연고』를 냈을 만큼 왕성하게 시를 쓰고 있음.  감 상 문 김남호 / 문학평론가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가올 시간이지만 이미 충분히 예견된 탓에 낯설지 않은 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노후(老後)야말로 ‘오래된 미래’ 중 하나지요.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피해 갈 수 없는 외길에서 지금의 이 단계를 지나면 다음 코스에서는 뭐가 나올지 우린 다 알지요. 다 알기 때문에 오래되었고, 그럼에도 아직은 오지 않았기에 미래(未來)인 거지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낭송가의 떨리고 갈라지는 목소리에 실려 낭송된 이 시는 청중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젖게 하였습니다.  좋은 낭송은 시(詩) 속의 ‘나’와 낭송하는 ‘나’와 그것을 듣는 ‘나’를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주인인 기억이 하나둘 나를 빠져나가서 마침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는 나이. 나는 창문을 열려고 갔다가 그새 거기 간 목적을 잊어버리고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무엇을 꺼내려고 냉장고에 갔다가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앞이 막막하고 울컥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차분하게 이 참담한 상황을 정리 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일 뿐이라고. 그리고 자책하는 목소리에 담아 우리를 나무라지요. 거창하게 인생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하며 마치 삶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나 한 것처럼 핏대를 올리는 당신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고. 진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나 사이’의 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셈이지요.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나이...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은 생각에 가슴이 멍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망각의 세월 속으로 묻히는 삶 이것이 인생인가요? [출처] 모르는 사이가 알아가며 살다가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작성자 에셋 디자이너 이종헌 ? 좋은 글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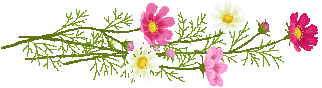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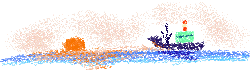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