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sic: 지나가는비 벼락부자의 유래 (야화) 조실부모하고 친척 집을 전전하던 순둥이는 부모가 남긴 논 서마지기 문서를 들고 외삼촌 집으로 들어갔다. 변변치 못한 외삼촌이란 인간은 허구 헌 날 금쪽같은 순둥이의 논 서마지기를 몽땅 날려 버렸다. 열일곱이 된 순둥이는 외삼촌 집을 나와 오 씨네 머슴으로 들어갔다.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한 순둥이를 모진 세상은 끊임없이 등쳐 먹었다. 죽으라고 일해 계약된 3년이 꽉 차자, 오 씨는 이런저런 핑계로 새경을 절반으로 깎아 버렸다. 사람들은 사또에게 고발하라고 했지만. 순둥이는 관가로 가다가 발걸음을 돌려 주막집에서 술을 퍼마시고 분을 삭였다. 반밖에 못 받았지만 그 새경으로 나지막한 둔덕산을 하나 사고.  골짜기에 한 칸짜리 초가집을 짓고 밤낮으로 둔덕을 일궜다. “흙은 나를 속이지 않겠지”? 그는 이를 악물고 잡목을 베어 내고 바위를 굴려 내고 돌을 캐냈다. 한 뼘 한 뼘 밭이 늘어나는 게 너무나 기뻐 어떤 날은 달밤에 혼자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남은 새경이 바닥날 때쯤 한 마지기 남짓 일궈 놓은 밭에 조와 메밀을 심어 양식을 하고,  겨울이면 읍내에 가서 엽전 몇 닢에 남의 집 통시를 퍼 주고 그 똥통을 메고 와서 밭에 뿌렸다. 언 땅이 녹자마자 또다시 화전을 일구기를 5년, 둔덕산은 번듯한 밭으로 변했다. 그해 봄, 순둥이는 콩 세 가마를 장리로 들여와 밭에 심기 시작했다. 콩을 심는 데만 꼬박 이레가 걸렸다. 콩을 다 심고 순둥이는 주막으로 내려가 술을 마셨다.  부엌에서 일하는 열아홉 살 주모의 질녀 봉선이를 점찍어 두고 가을에 콩을 추수하면 데려다 혼례를 올리겠다고 마음먹고 주모의 귀띔도 받아 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부슬부슬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신명(天地神明) 님.” 순둥이는 두 팔을 벌려 비를 맞으며 하늘을 향해 절했다. 단비는 땅 깊숙이 스며들어 흙 속의 생명들을 일깨웠다.  이튿날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하늘은 맑고 남풍은 불어 대지를 따뜻하게 데웠다. 며칠 후 노란 콩 싹들이 올라오더니 떡잎을 활짝 펼쳤다. 콩은 쑥쑥 자라 한여름이 오기 전에 땅을 덮었다. 겨울마다 똥지게로 퍼 나른 인분 거름을 먹고 콩잎은 싱싱하게 팔을 벌렸다. 가을이 되자 콩잎은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포기마다 주렁주렁 콩만 남았다.  순둥이의 입이 귀에 걸렸다. 순둥이는 콩을 뽑아 둔덕 위에 쌓기 시작했다. 달을 보며 별을 보며 콩을 뽑아도 힘든 줄을 몰랐다. “이모(姨母)가 이거 갖다 주라고 합디다.” 봉선이가 노란 저고리를 차려입고 한 손엔 막걸리 호리병을, 또 한 손엔 찐 고구마를 들고 콩밭에 왔다. “봉선아. 나는 부자(富者)여!~ 이 콩이 마른 후 타작을 하면 스무 섬은 나올 거야.”!!  호리 병째로 벌컥벌컥 막걸리를 들이켠 순둥이는 와락 봉선이를 껴안았다. 입이 입에 틀어 막혀 말을 못 하고 손으로 토닥토닥 순둥이 가슴을 치던 봉선이 손이 어느새 순둥이 목을 감싸 안았다. 순둥이의 억센 손이 봉선이의 치마를 올리고 고쟁이를 벗겨 내렸다. 순둥이는 윗옷을 벗어 콩 더미 옆에 깔고 봉선이를 눕혔다. 달빛을 머금은 스물다섯 순둥이의 구릿빛 등짝과 엉덩이가 물결치자 봉선이는 가쁜 숨만 몰아 뿜었다.  순둥이는 마지막 큰 숨을 토해 내고 옆으로 쓰러지며 구수한 흙냄새를 맡았다. 어머니의 젖 냄새 같기도 하고 아버지 등짝에 업혔을 때의 땀 냄새 같기도 한 흙냄새! 그는 흙을 한 움큼 쥐고 소리쳤다. “봉선아, 이건 황금(黃金)이여.” 옷매무새를 고쳐 입은 봉선이는 부끄러운 듯 빈 호리병을 들고 휑하니 가 버렸다. 바닥에 깔았던 순둥이의 옷에 선명한 붉은 핏자국이 아직도 비린내를 뿜었다.  순둥이가 콩을 뽑아 둔덕 위에 쌓아 올린 더미가 집채보다 커졌다. 가을볕에 콩은 말라 갔다. 콩깍지가 저절로 벌어질 때쯤 멍석을 대여섯 장 깔고 타작을 할 참이다. 순둥이가 주막(酒幕)에서 점심(點心)을 먹을 때였다. “짜자 짜자 짱!” "쿠르 르 카아 캉 캉캉~!!!" 하늘을 찢고 땅을 가를 듯이 마른 번개가 네댓 차례나 내리쳤다.  “순둥이 여기 있는가. 빨리 나와 봐.” 고함 소리에 뛰쳐나간 순둥이는 얼어붙었다. 멀리 둔덕에 쌓아 둔 콩 더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이다. 순둥이가 달려가고 동네 사람들이 뒤따랐지만 마른 콩 더미의 불길은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다. 새까만 숯덩이만 남은 둔덕에서 순둥이는 “하늘도 나를 속이고 땅도 나를 속이는구나”  짐승처럼 울부짖고, 봉선이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동네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순둥이는 목을 매려다.•• 봉선이 입덧을 하는 통에 생각을 바꿨다. 술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검은 두건을 쓰고 긴 수염을 늘어뜨린 채 옥색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노인 한 분이 주막으로 찾아왔다.  “벼락 맞은 콩 주인장 계시오.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순둥이가 나가자, 범상치 않은 그 노인은 새까맣게 탄 콩 한 자루를 쓸어 담아 데려온 사동(私童)의 등에 얹었다. “준비(準備) 해 온 돈이 이것뿐이요. 벼락 맞은 콩은 자고로 진귀(珍貴) 한 명약(名藥)이요. 내 이것으로 시험(試驗) 해 보고 다시 오리다.” 그가 떠난 후 받은 전대를 열어 본 순둥이는 깜짝 놀랐다. 콩 열섬 값이 넘었다.  소문을 듣고 팔도강산의 명의(名醫)들이 쉼 없이 찾아왔다. 순둥이는 새까맣게 탄 콩 가마니를 쌓아 두고 찾아온 의원(醫員) 들에게 팔았다. 벼락 맞은 콩은 욕창·등창·문둥병에 특효약(特效藥) 이었다.  동짓달 스무이레, 그날따라 봄날처럼 따뜻했다. 온 동네 잔치판이 벌어졌다. 순둥이와 배가 살짝 부른 봉선이의 혼례(婚禮) 날이었다. 그 이후 순둥이가 벼락 맞은 콩을 팔아 부자가 된 것에서 유래해 '벼락부자라'는 말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 좋은 글 중에서 🔶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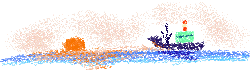 |